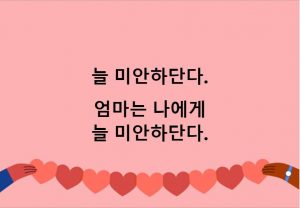명재고택@논산with아내
물파스 사랑
“엄마 나 두 방 물렀네 @@”
“이따 잘 때 푸막끼 한 번 품고 자믄도ㅑㅡ 물파스 발러. 게란디 바르믄 따꼼따꼼혀! 글믄 싹 가란져!!!”
“알았어 엄마”
난 엄마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착~하고 달라붙어 밍기적 밍기적 거린다. 드디어 엄마가 오른손에 물파스를 들고 게으른 자식을 찾아 오신다. ㅋㅋ
“어디여? 물파스 바르랑게…”
난 엄마에게 여기 여기 하며 여러 군데을 가르켰다.
“어디여? 뺄간헌디가 안뵈는디?”
눈이 어두우신 엄마는 내 등짝 여기 저기에 꾹꾹 눌러주듯 물파스를 발라주셨다.
참 좋다.
행복 별거 아니다. 마흔여섯살 큰아들 등에 물파스 발라주시는 엄마도 나도 행복하다.
글은 나다
글은 참 묘하다. 정서가 그대로 묻어난다. 평소 아버지께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엄마에게는 편하게 말하는 내가 보인다.
그래서 그럴까? 문득 넋두리 처럼 흘러나온 말을 컴퓨터 자판으로 꾹꾹 눌러 옮겨 본다. 그리고 멍하니 엄마를 생각해 본다. 버릇없다 생각되어 눌러쓴 글을 요로코롬 저로코롬 수정해봐도 맘에 들지 않는다. 버릇 없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내 언어로 쓴 반말이 나는 좋다.
늘 미안하단다.
엄마는 나에게
늘 미안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