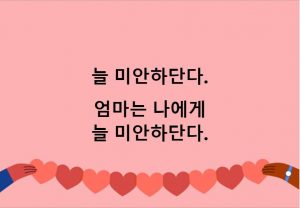“엄마 나 두 방 물렀네 @@”
“이따 잘 때 푸막끼 한 번 품고 자믄도ㅑㅡ 물파스 발러. 게란디 바르믄 따꼼따꼼혀! 글믄 싹 가란져!!!”
“알았어 엄마”
난 엄마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착~하고 달라붙어 밍기적 밍기적 거린다. 드디어 엄마가 오른손에 물파스를 들고 게으른 자식을 찾아 오신다. ㅋㅋ
“어디여? 물파스 바르랑게…”
난 엄마에게 여기 여기 하며 여러 군데을 가르켰다.
“어디여? 뺄간헌디가 안뵈는디?”
눈이 어두우신 엄마는 내 등짝 여기 저기에 꾹꾹 눌러주듯 물파스를 발라주셨다.
참 좋다.
행복 별거 아니다. 마흔여섯살 큰아들 등에 물파스 발라주시는 엄마도 나도 행복하다.